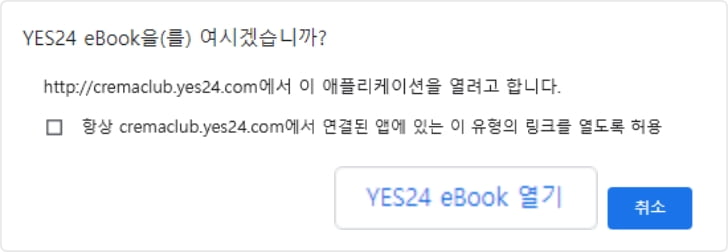이 상품의 태그
-
천선란 저
-
무라타 사야카 저/김석희 역
-
조해주 저
-
나오미 크리처 저/신해경 역
책 소개
목차
채널예스 기사 (1개)
-
2023년 05월 17일
출판사 리뷰
회원 리뷰 (3건)
한줄평 (11건)
0/50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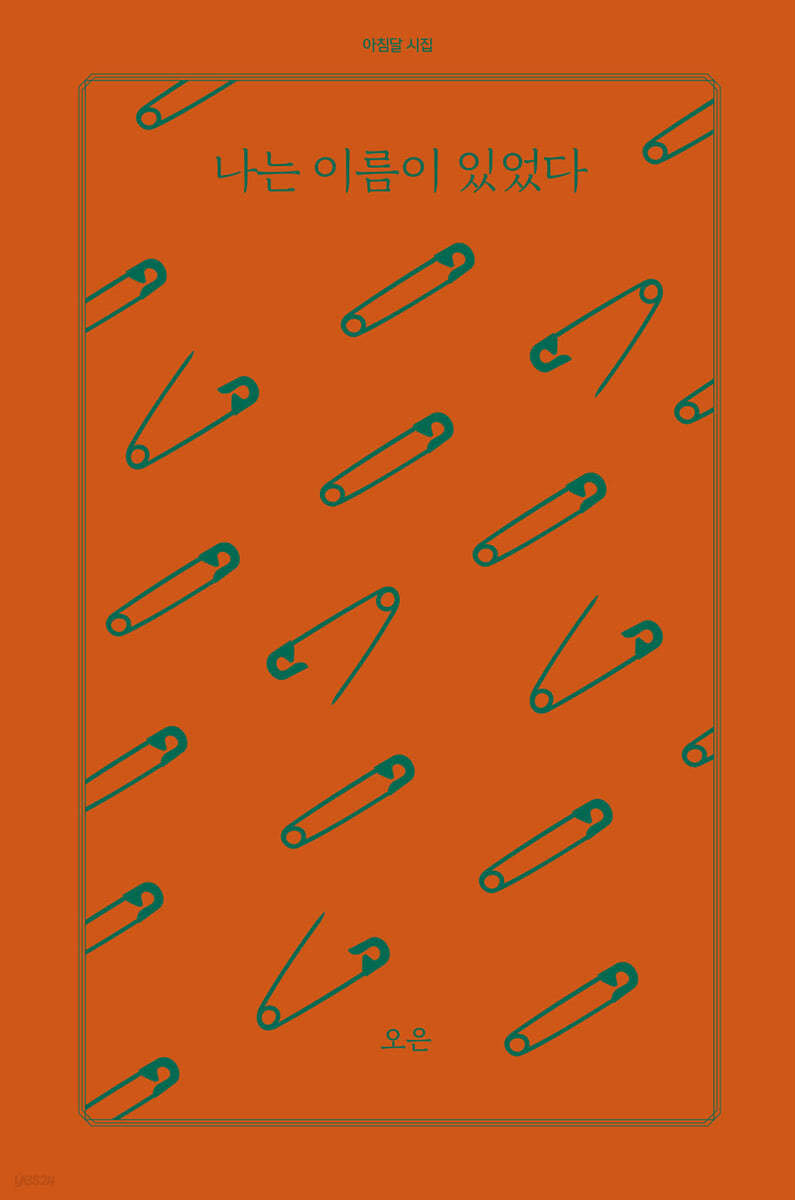

)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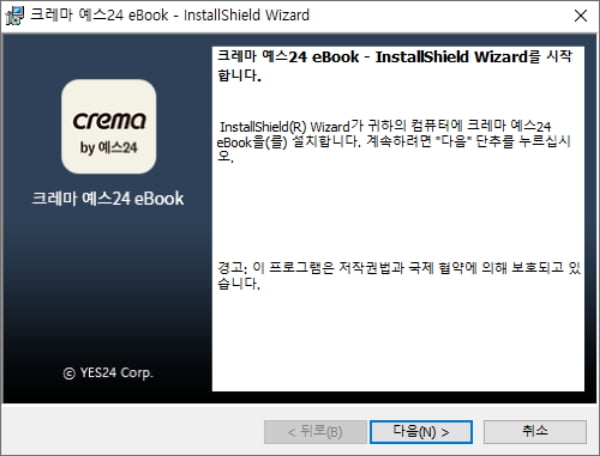
![크레마클럽 도서 [바로 읽기] 클릭](https://image.yes24.com/sysimage/renew/corner/bookClubV2/img_install_02.jpg)
![크레마클럽 도서 [바로 읽기] 클릭](https://image.yes24.com/sysimage/renew/corner/bookClubV2/img_install_03.jpg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