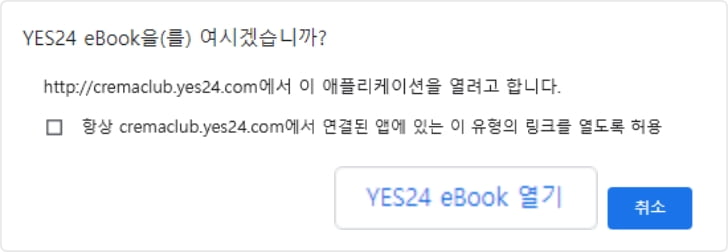릴케 시집
이 상품의 태그
-
나태주 저
-
윤동주 저/윤동주100년포럼 편
책 소개
목차
채널예스 기사 (1개)
-
2022년 10월 04일
출판사 리뷰
회원 리뷰 (40건)
한줄평 (45건)
0/50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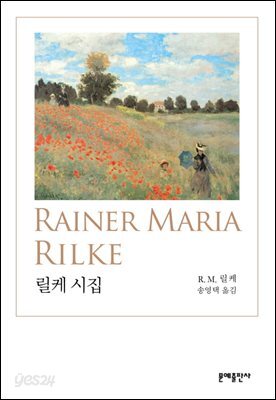

![[편집자K의 반쯤 빈 서재] 밤의 미술관](https://image.yes24.com/images/chyes24/0/c/a/c/0cac3080aeeebd7f255acd50a52d018c.jpg))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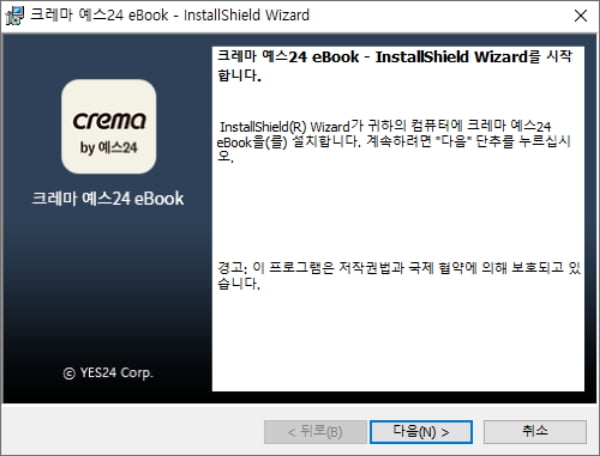
![크레마클럽 도서 [바로 읽기] 클릭](https://image.yes24.com/sysimage/renew/corner/bookClubV2/img_install_02.jpg)
![크레마클럽 도서 [바로 읽기] 클릭](https://image.yes24.com/sysimage/renew/corner/bookClubV2/img_install_03.jpg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