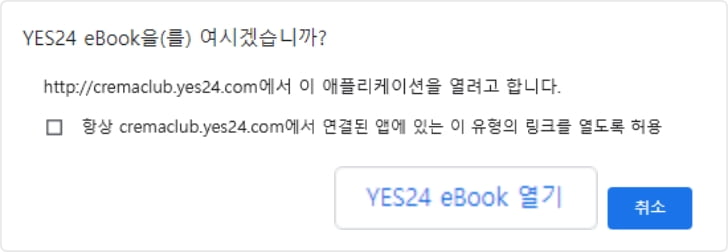이 상품의 태그
-
고호관 저
-
최기혁,김대영,김방엽,김연규,신재성,이종원,이주희,정서영 공저
-
박에스더 저
책 소개
목차
상세 이미지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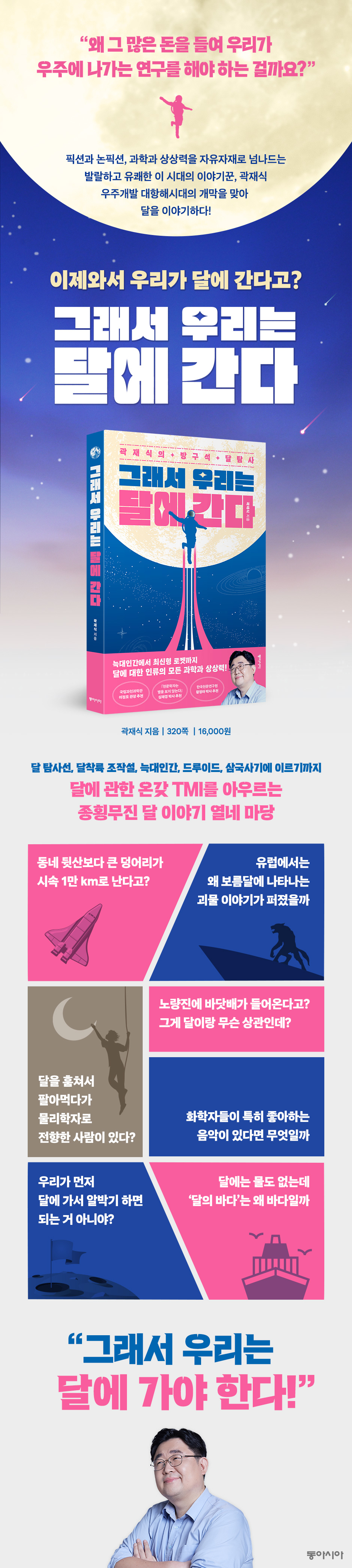
출판사 리뷰
회원 리뷰 (38건)
한줄평 (16건)
0/50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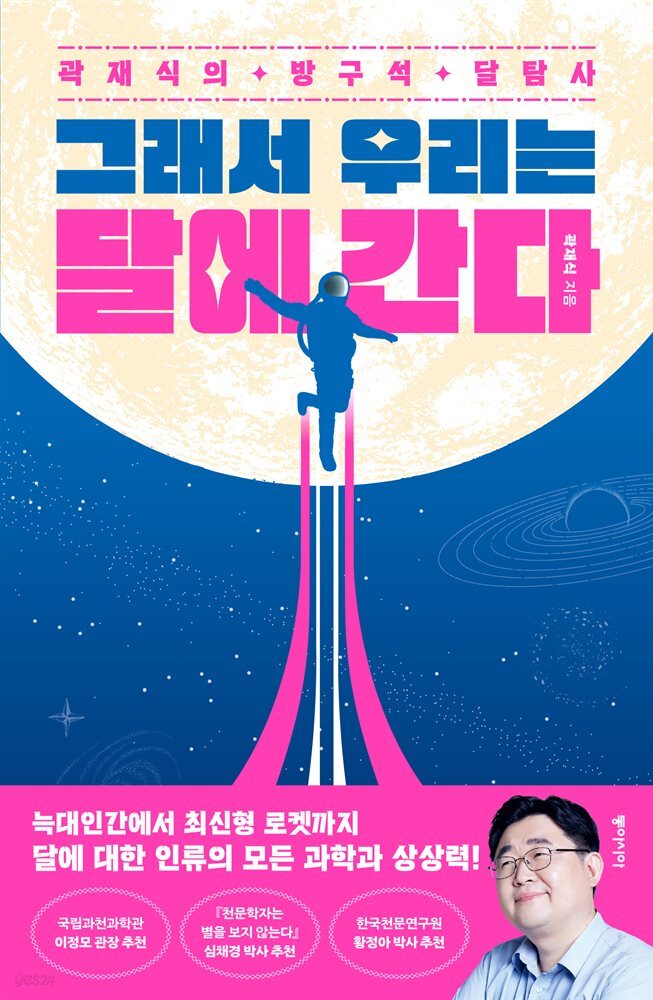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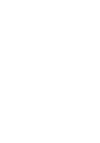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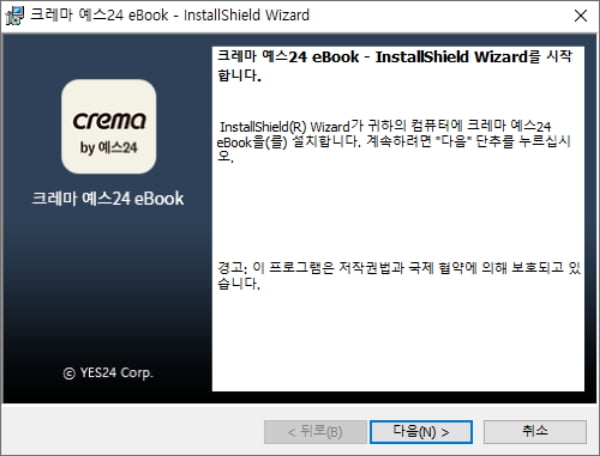
![크레마클럽 도서 [바로 읽기] 클릭](https://image.yes24.com/sysimage/renew/corner/bookClubV2/img_install_02.jpg)
![크레마클럽 도서 [바로 읽기] 클릭](https://image.yes24.com/sysimage/renew/corner/bookClubV2/img_install_03.jpg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