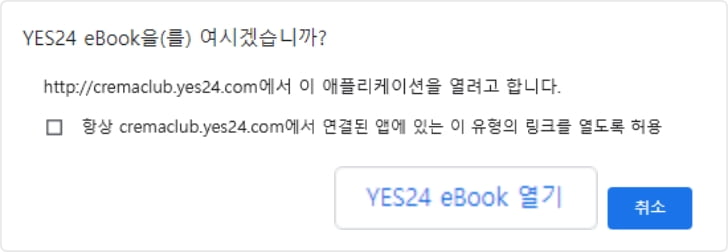이 상품의 태그
-
앤디 위어 저/강동혁 역
-
김초엽 저
-
천선란 저
-
델리아 오언스 저/김선형 역
-
류쉬안 저/원녕경 역
책 소개
목차
채널예스 기사 (3개)
-
[올해의 책] 작가, 출판인, 기자, MD 50인의 '올해의 책'
2020년 12월 01일
-
2020년 07월 20일
-
[내 마음을 돌보는 시간] 나를 괴롭게 하는 마음 습관에서 벗어나는 법
2020년 07월 14일
상세 이미지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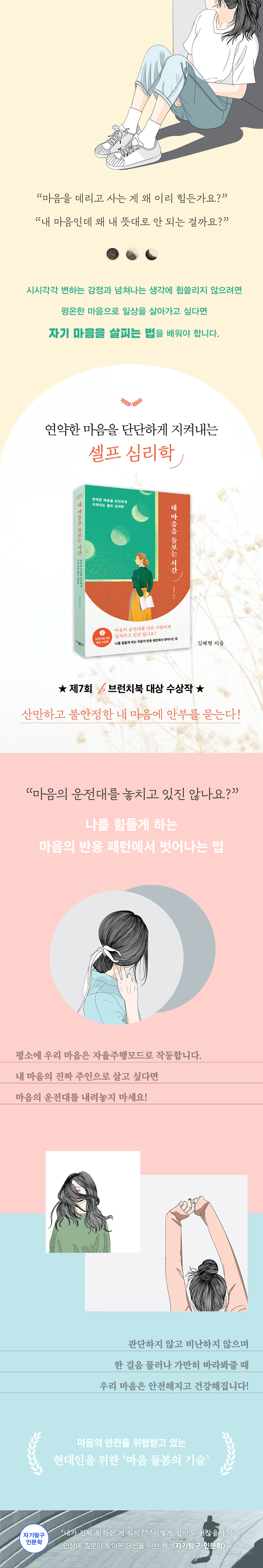
출판사 리뷰
회원 리뷰 (35건)
한줄평 (26건)
0/50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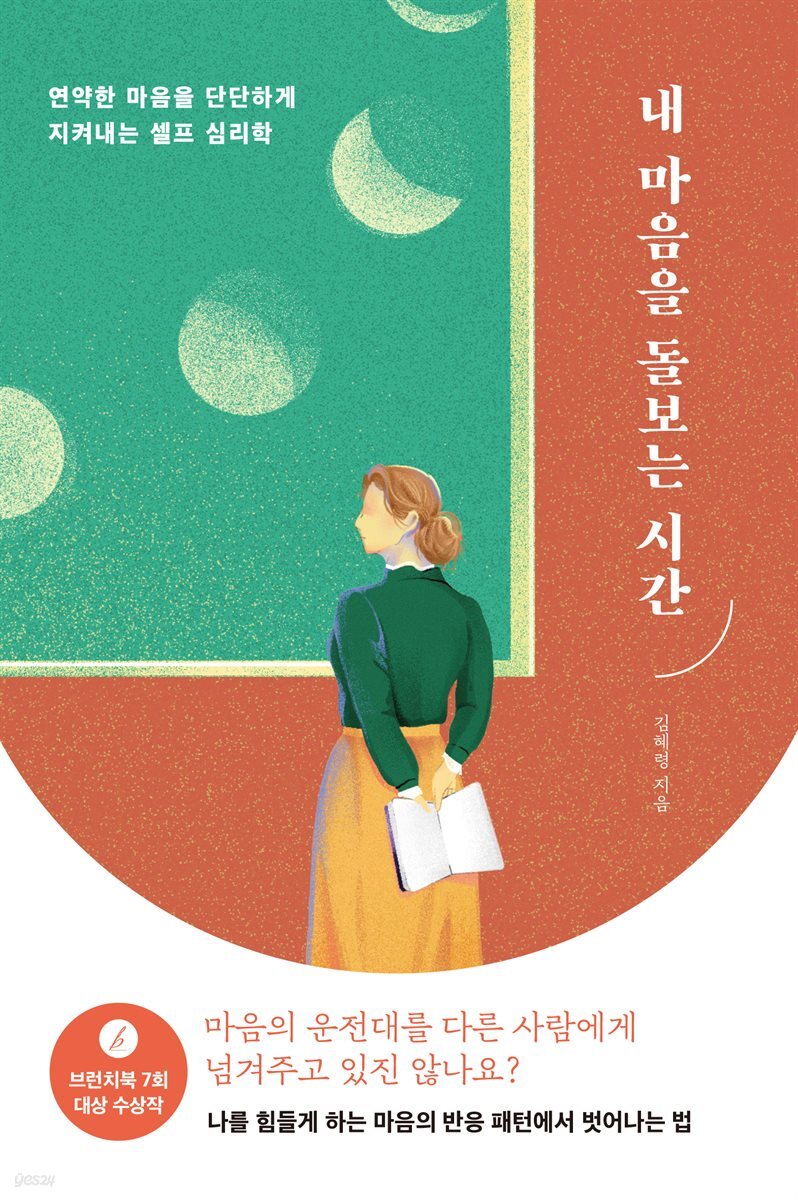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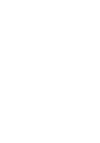
![[올해의 책] 작가, 출판인, 기자, MD 50인의 '올해의 책'](https://image.yes24.com/images/chyes24/c/7/d/e/c7de5c7f378bb50493573aafb2593bac.jpg))
)
![[내 마음을 돌보는 시간] 나를 괴롭게 하는 마음 습관에서 벗어나는 법](https://image.yes24.com/images/chyes24/0/a/b/b/0abb96e11d005448d066698042942ead.jpg))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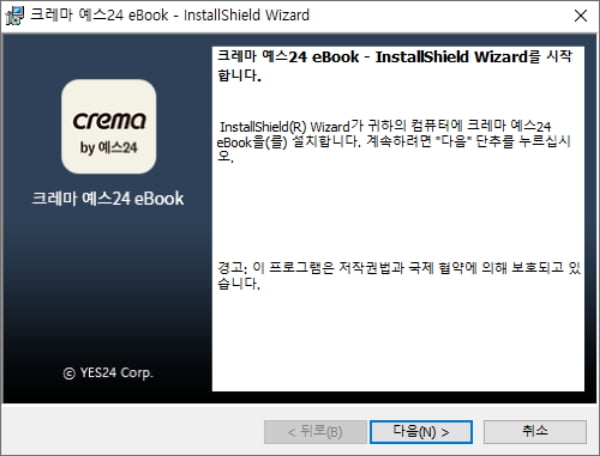
![크레마클럽 도서 [바로 읽기] 클릭](https://image.yes24.com/sysimage/renew/corner/bookClubV2/img_install_02.jpg)
![크레마클럽 도서 [바로 읽기] 클릭](https://image.yes24.com/sysimage/renew/corner/bookClubV2/img_install_03.jpg)